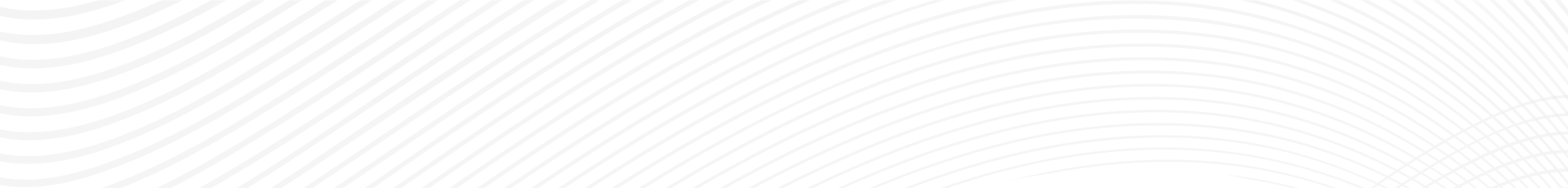[24-11-19] [금강일보-대전시 공동기획:2024 대전 청년을 말하다] 스스로 꿈을 향하는 소녀들… 김유나·전은수
페이지 정보
본문
[금강일보-대전시 공동기획:2024 대전 청년을 말하다] 스스로 꿈을 향하는 소녀들… 김유나·전은수

방황은 어찌 보면 가장 청년다움이다. 특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신의 진로를 향해 꿈을 향하는 모습은 어리숙하면서도 참 대견한 마음이 든다. 혹여 우리는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모습에 조언을 가장한 참 많이 참견한다. 우리는 그렇게 꼰대가 돼 가는 것일 수도 있다. 대전시사회혁신센터의 ‘계층별 문제해결 네트워크’ 사업 일환으로 대전지역 고등학교 신문 복원을 위한 마중물 프로젝트인 ‘대전四季(대전사계)’ 1기 기자단으로 활동한 김유나(19·여), 전은수(18·여) 양은 여느 청년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속도를 내지 못하지만 이들에게 조언은 필요 없다. 우리는 이정표만 돼 주면 된다.
◆언어에 많은 재능 가져
김 양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빨리 접했다. 그의 어머니가 영어를 잘했기에 영어가 친근할 수 있도록 조기교육 차원에서 그에게 영어를 직접 가르쳤다. 어릴 적부터 접하는 모국어의 중요성이 있기에 ‘영어를 빨리 접해 혹여 한국말을 잘 못하면 어쩌지’란 우려가 주변에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김 양은 언어 습득에 제법 자질을 보였다고. 원어민과 고급 회화를 할 정도까진 아니지만 자신의 의사를 한국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영어로도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 양의 어머니는 김 양의 능력을 단번에 알아챘단다. 내 딸이 어학에 상당한 재능을 갖고 있었다는 걸. 그래서 김 양은 어머니 손을 잡고 도서관은 물론 여러 서점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고 김 양 역시 새로운 언어나 단어, 용어를 배우는 것에 제법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글로 잘 정리하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언론에 관심이 부쩍 갖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학교에 다니면서도 신문부에 큰 관심을 보였고 서일여자고등학교에서 진학해 라온소리라는 신문 동아리에 가입하며 왕성하게 활동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생각해본 건 언론계에서 일하는 거예요. 어렸을 적 어머니 말씀처럼 언어 쪽에도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서 언어 계통에서 일하는 것에도 열려 있고요. 나중엔 또 뭐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학교 신문을 만드는 것도, 대전사계에 참여한 것도 너무 재밌어요.”
김 양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빨리 접했다. 그의 어머니가 영어를 잘했기에 영어가 친근할 수 있도록 조기교육 차원에서 그에게 영어를 직접 가르쳤다. 어릴 적부터 접하는 모국어의 중요성이 있기에 ‘영어를 빨리 접해 혹여 한국말을 잘 못하면 어쩌지’란 우려가 주변에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김 양은 언어 습득에 제법 자질을 보였다고. 원어민과 고급 회화를 할 정도까진 아니지만 자신의 의사를 한국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영어로도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 양의 어머니는 김 양의 능력을 단번에 알아챘단다. 내 딸이 어학에 상당한 재능을 갖고 있었다는 걸. 그래서 김 양은 어머니 손을 잡고 도서관은 물론 여러 서점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고 김 양 역시 새로운 언어나 단어, 용어를 배우는 것에 제법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글로 잘 정리하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언론에 관심이 부쩍 갖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학교에 다니면서도 신문부에 큰 관심을 보였고 서일여자고등학교에서 진학해 라온소리라는 신문 동아리에 가입하며 왕성하게 활동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생각해본 건 언론계에서 일하는 거예요. 어렸을 적 어머니 말씀처럼 언어 쪽에도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서 언어 계통에서 일하는 것에도 열려 있고요. 나중엔 또 뭐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학교 신문을 만드는 것도, 대전사계에 참여한 것도 너무 재밌어요.”
◆공부보다 더 좋은 독서
전 양 역시 김 양과 비슷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렸을 때 단순히 동화책을 습작하는 걸로 놀았던 그는 조금 머리가 크자 에세이 형식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 바탕엔 엄청난 독서량이 있었다. 심심하면 책을 읽고 주말엔 도서관에 갔다. 좋은 책이 있으면 페이지가 해질 때까지 책장을 넘겼고 좋은 글귀가 있을 땐 따로 메모한 뒤 자신의 글에 적용해 보곤 했단다. 중학생이 되고 나선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소설도 써 봤다고. 낭중지추라고 했던가.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 당시 한 교사가 그에게 도서부에 가입하라고 권유했고 그의 독서량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었다. 동아리 활동 중 글쓰기 강의도 제법 들었고 방학 중엔 도서부원 8명이 모여 집단지성을 통해 집필해 출간하기도 했단다. 아직은 모든 게 부끄러운 이팔청춘이라 그런지 책 제목은 죽을 때까지 소녀가 간직해야 할 비밀이란다. 그래도 출간까지 한 걸 보면 제법 책다운 책이었다고.
“사실 공부보다 독서에 더 관심 많았어요. 그래서 책을 써보기로 했을 때 정말 가슴이 떨렸죠. 한창 작업할 땐 방학이 방학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나가 원고 작업하고 땅거미가 지면 하교했어요. 안 힘들었다면 거짓이겠지만 살면서 가장 재밌던 순간 중 하나였죠. 그렇게 중학생의 마지막을 출간으로 마무리하고 서일여고에 입학했어요.”
전 양 역시 김 양과 비슷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렸을 때 단순히 동화책을 습작하는 걸로 놀았던 그는 조금 머리가 크자 에세이 형식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 바탕엔 엄청난 독서량이 있었다. 심심하면 책을 읽고 주말엔 도서관에 갔다. 좋은 책이 있으면 페이지가 해질 때까지 책장을 넘겼고 좋은 글귀가 있을 땐 따로 메모한 뒤 자신의 글에 적용해 보곤 했단다. 중학생이 되고 나선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소설도 써 봤다고. 낭중지추라고 했던가.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 당시 한 교사가 그에게 도서부에 가입하라고 권유했고 그의 독서량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었다. 동아리 활동 중 글쓰기 강의도 제법 들었고 방학 중엔 도서부원 8명이 모여 집단지성을 통해 집필해 출간하기도 했단다. 아직은 모든 게 부끄러운 이팔청춘이라 그런지 책 제목은 죽을 때까지 소녀가 간직해야 할 비밀이란다. 그래도 출간까지 한 걸 보면 제법 책다운 책이었다고.
“사실 공부보다 독서에 더 관심 많았어요. 그래서 책을 써보기로 했을 때 정말 가슴이 떨렸죠. 한창 작업할 땐 방학이 방학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나가 원고 작업하고 땅거미가 지면 하교했어요. 안 힘들었다면 거짓이겠지만 살면서 가장 재밌던 순간 중 하나였죠. 그렇게 중학생의 마지막을 출간으로 마무리하고 서일여고에 입학했어요.”
◆뽀얀 아기에서 이젠 청년으로
김 양과 전 양은 그렇게 같은 학교 동문이 됐다. 여기서 이야기 끝난다면 둘은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만 남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김 양이 라온소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던 2학년일 때 전 양이 라온소리에 가입하며 둘의 인연이 시작됐다. 둘은 너무나도 비슷한 것에 취미를 가졌고 비슷한 것에 아름다움을 느꼈다. 그리고 비슷한 것에 슬픔을 공유했다. 그들은 비슷한 감정을 서로의 노트에 메모했고 그렇게 많은 걸 경험했다. 그러다 어느날. 전 양이 혁신센터의 대전사계 참가자 모집 소식을 듣고 김 양을 찾아가 그를 설득했다. 글 쓰는 것에 관심이 컸던 만큼 이들은 이번에도 함께 하자는 것에 합의했다.
“라온소리에서 직접 학교신문을 만들긴 하는데 1년에 한 번 발행돼요. 가끔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우연찮은 기회에 대전사계 소식을 들었고 ‘진짜 기사 한 번 써보자’는 것에 우리 모두 공감했어요. 그렇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우리의 이야기를 직접 취재하고 써보게 됐어요. 사실 여전히 기성 언론엔 우리의 목소리가 담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기사가 있겠죠. 시작은 우리의 대전사계라고 생각합니다.”
김 양과 전 양은 그렇게 같은 학교 동문이 됐다. 여기서 이야기 끝난다면 둘은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만 남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김 양이 라온소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던 2학년일 때 전 양이 라온소리에 가입하며 둘의 인연이 시작됐다. 둘은 너무나도 비슷한 것에 취미를 가졌고 비슷한 것에 아름다움을 느꼈다. 그리고 비슷한 것에 슬픔을 공유했다. 그들은 비슷한 감정을 서로의 노트에 메모했고 그렇게 많은 걸 경험했다. 그러다 어느날. 전 양이 혁신센터의 대전사계 참가자 모집 소식을 듣고 김 양을 찾아가 그를 설득했다. 글 쓰는 것에 관심이 컸던 만큼 이들은 이번에도 함께 하자는 것에 합의했다.
“라온소리에서 직접 학교신문을 만들긴 하는데 1년에 한 번 발행돼요. 가끔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우연찮은 기회에 대전사계 소식을 들었고 ‘진짜 기사 한 번 써보자’는 것에 우리 모두 공감했어요. 그렇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우리의 이야기를 직접 취재하고 써보게 됐어요. 사실 여전히 기성 언론엔 우리의 목소리가 담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기사가 있겠죠. 시작은 우리의 대전사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대전사계 발행일에 김 양과 전 양은 자신의 피와 땀이 담긴 신문을 들고 귀가했다. 두 어머니는 같은 반응이었다. 평생 물가에 내놓은 아기 같기에 늘 걱정스러운 모습만 봤겠지만 이날만큼 두 딸이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어엿한 청년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어. 자랑스럽다.”
글·사진=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어. 자랑스럽다.”
글·사진=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기사 원문 보기]